나는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노동조합 투쟁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부딪힌 이후로 자연스럽게 노동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혁모임에 함께 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차례의 토론회를 경과하면서 뜻을 함께 하는 동지들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북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전북모임을 구성하고 지역동지들과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변혁적 현장실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노동자 계급정당’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았다. 그리고 나 역시 이 동지들과 함께라면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토론회가 진행될수록 동지들은 늘었고, 이것은 함께하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노동조합 투쟁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토론회에서 만난 현장 활동가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흔쾌히 함께하자고 하는 동지, ‘현장활동만 하면 되는데 뭘 그런 것을 하느냐’는 동지, 아예 배타적인 동지.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함께 활동해온 동지들의 냉소와 의구심의 눈초리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 말하자면 ‘나는 이런 정치를 지지한다’,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변혁모임 토론회에 함께 하기 위해서 동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정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위축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던 것은 지금까지 ‘이 길이 최선일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지역토론회와 대선투쟁을 경과하며, 나는 현장 노동대중이 노동자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바라보는 노동자 정치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으며,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었다.
좋지 않거나, 무관하거나, 좋기는 한데 누가 대신해주는 것, 그것이 노동자 정치를 바라보는 현장의 정서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대중의 정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노동자 정치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정치의 주체를 정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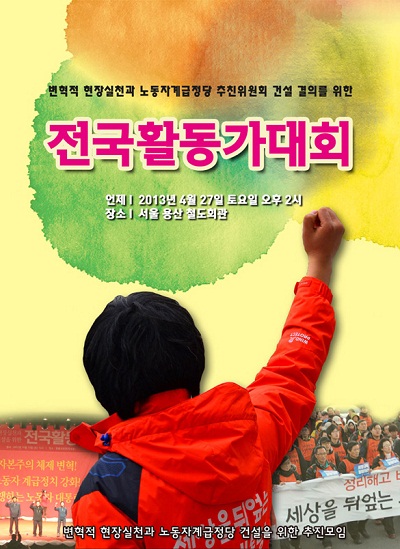 |
노동자 정치 무심하거나 누가 대신 해주거나
대선기간, 김소연 노동자 대통령 선거투쟁 당시였다.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잊히지 않는다.
“새로운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처음에는 열심히 잘할지는 몰라도 이후에는 노동현장에는 관심도 없고, 자리싸움이나 하는 것 아니냐?”
상황이 이렇다. 감히 말하자면, 우리의 임무는 역사적이다. 이토록 무너져버린 노동자 정치의 상황에서, 변혁모임은 현장노동 대중에 전망을 내보이고, 노동정치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야 하는 역사적인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대중의 냉소와 불신을 극복하고 노동자 민중을 노동자 정치의 주체로 세워낼 때만, 우리는 진정한 정치세력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어떤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본과 권력에 맞서 선봉에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 노동조합 활동에는 그 누구보다 전투적이지만 다른 전망에 부정적인 동지들을 의미있는 세력으로 묶어세우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 활동가와 대중을 만나야 한다. 망설이는 동지가 있다면 손을 잡아줘야 하고, 설득할 동지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변혁모임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다.
지난 기간,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서 오는 갑갑함이 많았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중앙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본다. 그 결과 지역의 동지들도 일종의 의구심을 느꼈던 것 같다.
실질적인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을 위한 토대 구축의 정도를 가늠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공허함이었다. 눈에 보이는 만큼 힘이 된다. 지역별 상황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부족함을 채워가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것 같다.
글을 쓰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노동조합 활동만 하던 놈이 정치세력화에 뛰어들었던 지난 과정들이 스쳐가기도 했고, 만만치 않은 상황 자체가 답답하기도 했다.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 나 역시 주어지는 책무를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4월 27일, 많은 동지들을 만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