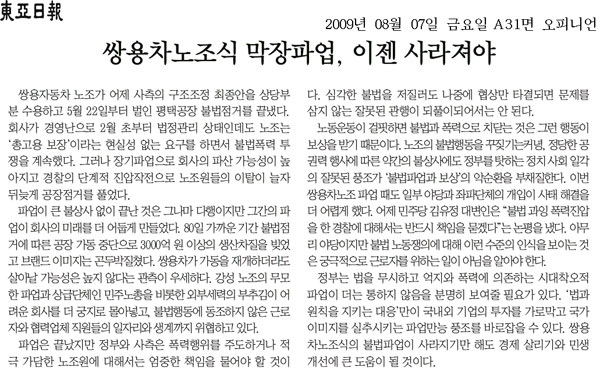 |
▲ <동아일보> 8월 7일자 사설 |
<동아일보>는 "쌍용차노조식 막장파업, 이젠 사라져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조가 '총고용 보장'이라는 현실성 없는 요구를 하면서 불법폭력 투쟁을 계속했다"며 "그간의 파업이 회사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었다"고 평했다.
"강성 노조의 무모한 파업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부추김이 어려운 회사를 더 궁지로 몰아넣고, 불법행동에 동조하지 않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자리와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노조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또 "파업은 끝났지만 정부와 사측은 폭력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심각한 불법을 저질러도 나중에 협상만 타결되면 문제를 삼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억지와 폭력에 의존하는 시대착오적 파업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도 "쌍용차노조 그대로 두고 회사 장래 없어"라는 사설을 내고 "노조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손실만 해도 자동차 1만4590대에 금액으로는 316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쌍용자동차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희망은 새로운 대주주를 구하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무엇보다 쌍용차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
▲ <조선일보> 8월 7일자 사설 |
<매일경제>는 "이번 사태는 기업 운명을 볼모로 삼는 노조의 극한 투쟁은 모두를 공멸로 이끌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소수 노조원들이 그토록 오래 생산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공권력의 엄정한 법질서 확립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제>도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이번 사태의 마무리를 결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태 가담자들에 대해선 경중을 따져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들었다.
이외에도 "한국 노동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잘못된 쟁의 문화의 유습에 물든 탓에 제 발등 찍기 식의 소모전을 벌인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민노총과 민노당 등 외부세력의 개입도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세계일보), "이번 농성장 주변에 몰려든 민노총 등 노동계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초기 행태는 해법보다 대립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국민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국민일보)고 노동계를 싸잡아 비난하는 시각도 많았다.
여러 신문들이 "노조 때문에" 쌍용차 회생 가능성을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일보>, <한겨레>는 각각 "쌍용차가 회생할 수 있게 도와주자", "쌍용차 회생에 정부.채권단 적극 지원을"이라는 사설을 내, 회생 노력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경찰이 이틀간 벌인 강제진압 작전은 무자비한 폭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측과 경찰은 노조원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을 언급했고 "정부는 적극적인 조정.중재 노력은커녕 공권력 뒤에 숨어 뒷짐만 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 상처만 입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